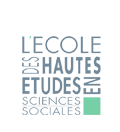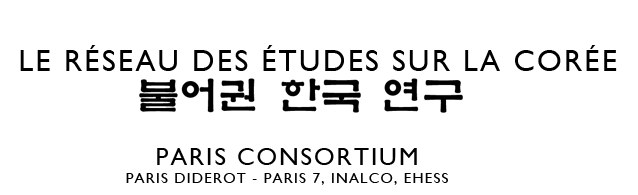Texte original : 만인보
Onglets principaux
작자의 말
시의 생활 30년이 돼 간다. 이 땅의 말로 시를 쓰는 일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더 절실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칠 만한 세월이기도 하다. 암울의 세월이기도 하다. 언젠가 나는 이 땅의 말로 시를 쓰는 것을 질곡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것이 현실의 질곡과 시의 질곡이 하나라는 사실로 인식됨으로써 나는 시가 역사의 산물임을 터득한 것이다. 30년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을 세월이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도.
그동안 내 시를 시라고 용인해 준 이 땅의 독자 여러분에게 조책감과 더불어 깊이 감사해 마지 않는다. 이 일 많은 땅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한 시인으로 일하도록 받아들여준 은혜 또한 크다. 이런 사실을 성찰할 때 나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시인이 될 의무로 새로와 진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말을 함부로 썼구나 하는 뼈ㅏ픈 회고도 회고려니와 이와 함께 내가 아프올 써야 할 말이 두려운 바 있다<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거듭나야 할 운명을 본다. 생각컨대 이 땅의 삼천리 강산 위에 내가 살고 있음이 엄연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인으로 사는 일을 다할 터이다. 시가 죽으면 진실이 죽는다. 노예로부터도 모험으로부터도 시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능히 역사의 이름으로 그래야겠다.
나의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동안 내 시의 행로 또한 다단한 바 있었다. 나는 방랑의 시대를 살았다. 그것은 동족상잔의 내전으로 인한 폐허를 떠도는 자의 역사에 대한 무책임을 자유로 착각한 전후 세대의 삶이었다. 허무가 내 청춘의 권리였다. 나는 6. 25로 산에 들어 갔고, 4. 19로 산에서 내려왔다.
역사는 이런 나의 삶에 각성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발견했을 때의 나의 감격은 아직가지도 선명하다. 70년대로부터.
더러 시련이랄 것도 없는 시련을 겪은 셈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나 혼자 겪는 것도 아닌 바에는 도리어 그 시련 가운데 내 시의 원천이 있음을 알게 된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가 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다른 계획들과 함께 꿈꾼 것이 이 "만인보"이다. 80년대 백두 남한산성 아래에서 살 때 이 계획이 떠올랐다가 이제야 그 꿈이 실현됙 시작한다. (나는 이제 서구시의 외세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내 긍지의 전부가 들어 있다.
지 전작시편 "만인보"는 막말로 말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한 노래의 집결이다. 나의 만남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적인 것이다. 이 공공성이야말로 개인적인 망각과 바임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삶 자체로서의 진실의 기념으로 그 일회성을 막아야 한다. 하잘 것 없는 만남 하나에도 거기에는 역사의 불가결성이 있다.
이 같은 원칙이 나에게 길들여진 바 사람들의 서사적인 숭엄성으로 되고 거기에서 이 시편이 나온 것이다. 여기세는 사람의 추악까지도 해당되어야 했다. 소위 진선미만으로는 사람을 다 밝힐 수 있는 때는 사실인즉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위선에만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 어린 시절의 기초환경으로부터 나아간다. 그것은 다음 단계인 편력시대의 여려 지역과 사회 각계 그리고 이 땅의 광막한 역사와 산야에 잠겨 있는 세상의 삶을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 현재화할 터이다.
이는 결국 가서 민족의 동시적 형상화가 들어 있어 마땅하다. 따라서 민족 생명력의 전형화 역시 덤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의 계속은 나의 사람에 대한 끝없는 시적 탐구이자 이름없는 역사행위이고자 한다. 시인이 역사의 곤능 없이는 살 수 없느 연유이겠다.
한마디로 덧부틴다면 서사시 "백두산"은 사람을 총체화하는 것인 반명 "만인보"는 민족을 객체의 생명성으로부터 귀납하는 수작이라고 해야겠다.
지난 20년 동안 이 땅의 문학과 민족현실의 엄정한 진로를 개척해 온 창작과 비평사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 이름 두 자만이 남겨진 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이토록 감회 깊은 판에 이 책이 나오게 된 점을 나는 마음 속에 아로새기고 있다. 우리는 넓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길다.
1980년대 복판을 지나며
고은